역사
한국인들은 어떻게 러시아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러시아 제국에서의 한국인 적응 과정.
1858년 아이훈 조약으로 아무르 지역이,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 지역이 러시아 제국에 편입된 직후부터 한국인들의 러시아 극동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주 주요 동기는 조선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요인과도 깊이 얽혀 있었는데, 백성들은 정부의 가혹한 압박에 시달렸고, 많은 가정이 안전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 러시아 영토로 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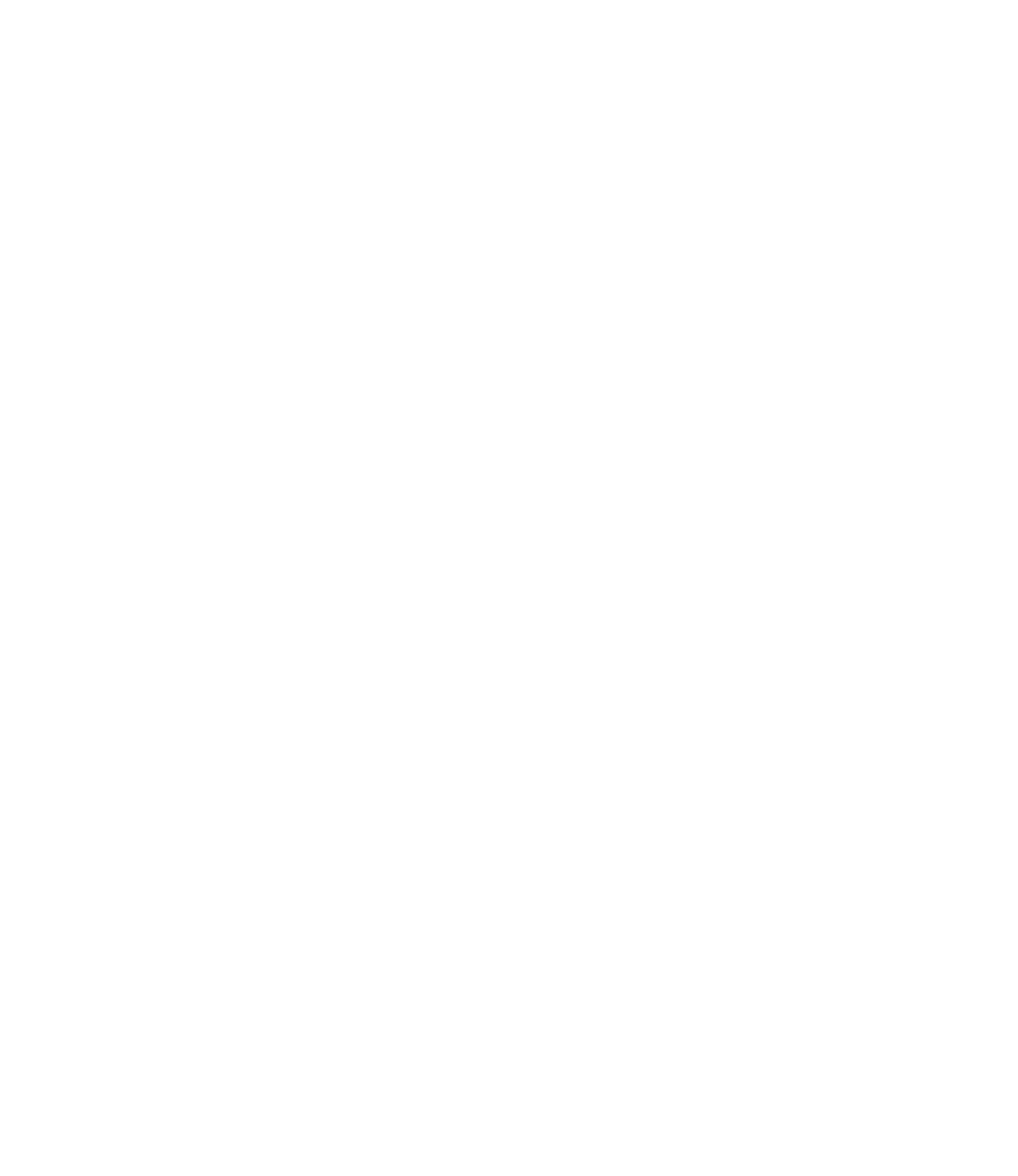
1870년 N.M. 프르제발스키가 작성한 우수리 지역 지도.
러시아에 들어온 한국인 초기 이주민들은 곧바로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 이주민들의 유입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행정당국 앞에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국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정착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장려할 것인가?
첫 번째 선택지는 곧 배제되었다. 이주민의 유입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경은 열려 있었고, 이를 통제할 자원도 부족했다. 게다가 러시아 극동 지역은 개발이 시급했고, 근면한 한국인 이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두 번째 길, 즉 정착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결정으로 여겨졌다.
러시아 당국의 한국인 이주에 대한 태도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어떤 이들은 한국인을 변두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근면한 농민으로 보았으나, 다른 이들은 성공적인 정착이 결국 연해주가 ‘러시아 지역이 아닌 한국 지역’이 될 것을 우려했다. 예컨대 총독 P. F. 운테르베르거(Unterberger)는 한국인들을 ‘황색 위협(黃禍)’이라고 불렀다.
한편, 조선 측에서도 이주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방 관리들은 인구 유출과 조세 기반의 축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곧 배제되었다. 이주민의 유입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경은 열려 있었고, 이를 통제할 자원도 부족했다. 게다가 러시아 극동 지역은 개발이 시급했고, 근면한 한국인 이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두 번째 길, 즉 정착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결정으로 여겨졌다.
러시아 당국의 한국인 이주에 대한 태도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어떤 이들은 한국인을 변두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근면한 농민으로 보았으나, 다른 이들은 성공적인 정착이 결국 연해주가 ‘러시아 지역이 아닌 한국 지역’이 될 것을 우려했다. 예컨대 총독 P. F. 운테르베르거(Unterberger)는 한국인들을 ‘황색 위협(黃禍)’이라고 불렀다.
한편, 조선 측에서도 이주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방 관리들은 인구 유출과 조세 기반의 축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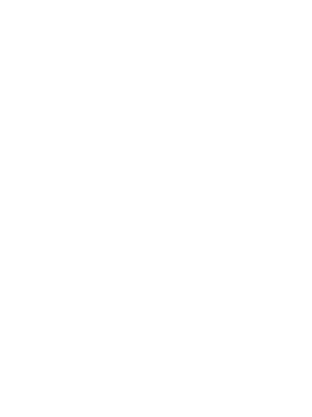
파벨 표도로비치 운테르베르거 — 연해주 주지사(1888–1897), 아무르 총독(1905–1910).
러시아 제국에서의 한국인 정착과 적응.
러시아 제국 영토에서의 한국인 정착은 매우 불균등하게 이루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인과 섞여 살았던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채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고립된 지역의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언어, 문화를 유지하며, 고향과 유사한 생활 방식을 이어갔다.
이와 같은 러시아인 사회로부터의 분리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러시아 당국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된 대규모 조선인 이주였다. 극동 행정당국은 한정된 자원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이주민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자 V.V. 그라베(Grave)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국인들에 대한 통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방치된 채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국인들의 밀집 정착지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연해주 남단, 조선과 국경을 맞댄 포시에트(Possiet) 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한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96%를 넘었으나, 북쪽으로 갈수록 정착 밀도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러시아 제국의 광대한 영토와 체계적인 이주 정책의 부재로 인해 일부 한국인들은 점차 극동을 떠나 시베리아, 러시아 유럽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인 정착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수는 매우 적었다. 1897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투르케스탄 지역에는 단 세 명의 한국인만이 있었으며, 코칸드와 나만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1860년대부터 1890년대에 걸쳐 극동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한국인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고립된 마을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와 같은 도시에도 정착하여 러시아인들과 교류하며 러시아 문화를 빠르게 습득하였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가난한 농민이었다. 조선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주민들로 인해 재산 축적은 어려웠다. 일부는 단기 노동을 위해 입국했지만, 대부분은 영구 정착과 시민권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891년 아무르 총독 바론 코르프(Korf)는 한국인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 명령을 발표하였다.
첫째, 1884년 6월 이전에 이주한 사람들은 러시아 시민권과 토지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았다.
둘째,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조선으로 송환 대상이 되었다.
셋째, 임시 거주자들은 특별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거주가 허용되었다.
이 조치는 한국인 사회 내부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켰다. 토지를 소유하고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은 ‘110인(스도셴니키, стодесятники)’이라 불리는 부유층을 형성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러시아 대학을 졸업한 첫 세대의 교육받은 한국인으로 성장하였다.
예로부터 교육은 한국인 사회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낯선 땅에서도 그들은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러시아 제국의 일원이 되면서 한국인들은 ‘러시아화(Русификация)’ 정책에 직면했다.
대부분의 한국인 이주민들은 조선 북부 출신으로, 서울 표준어와는 다른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방언은 고려사람들의 독특한 언어 형태인 ‘고려말(Корё мар)’의 기초가 되었으며, 15세기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보존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러시아어 학습은 이주민들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나세킨(Н. Насекин)은 다음과 같이 썼다.
“러시아 정부의 목표가 이민자들의 빠르고 확실한 동화에 있다면, 그 핵심 수단은 바로 러시아 학교일 것이다.”
1866년, 동시베리아 총독은 포시에트 항구에 러시아어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자금을 지원하였다.
극동 지역의 러시아어 교육은 국가학교, 교회 부속학교, 그리고 선교학교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인들은 언어 습득이 사회적 지위 향상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였다. 특히 러시아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지역의 한국인들이 그러했다.
20세기 초, 계몽운동가들과 항일운동가들, 그리고 공동체의 지원 덕분에 거의 모든 한국인 마을에는 학교가 세워졌다. 1917년까지 극동 지역에는 초등교육이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교육의 대중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금 부족, 교사 인력의 결핍, 그리고 고립된 거주 형태가 주요 장애 요인이었다.
학교와 더불어 정교회 역시 교육과 계몽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많은 사제들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종교 지도자이자 교사로서의 역할을 겸하였다. 한국인 교육은 선교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러시아어 교육은 종종 정교 개종으로 이어졌다.
프르제발스키(Н.M. Пржевальский)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한국인들의 러시아화에 중요한 수단은 정교회의 선교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육, 문화, 종교 전통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러시아–한국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는 러시아 내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독특한 역사적 출발점이 되었다.
러시아 제국 영토에서의 한국인 정착은 매우 불균등하게 이루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인과 섞여 살았던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채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고립된 지역의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언어, 문화를 유지하며, 고향과 유사한 생활 방식을 이어갔다.
이와 같은 러시아인 사회로부터의 분리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러시아 당국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된 대규모 조선인 이주였다. 극동 행정당국은 한정된 자원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이주민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자 V.V. 그라베(Grave)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국인들에 대한 통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방치된 채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국인들의 밀집 정착지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연해주 남단, 조선과 국경을 맞댄 포시에트(Possiet) 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한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96%를 넘었으나, 북쪽으로 갈수록 정착 밀도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러시아 제국의 광대한 영토와 체계적인 이주 정책의 부재로 인해 일부 한국인들은 점차 극동을 떠나 시베리아, 러시아 유럽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인 정착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수는 매우 적었다. 1897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투르케스탄 지역에는 단 세 명의 한국인만이 있었으며, 코칸드와 나만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1860년대부터 1890년대에 걸쳐 극동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한국인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고립된 마을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와 같은 도시에도 정착하여 러시아인들과 교류하며 러시아 문화를 빠르게 습득하였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가난한 농민이었다. 조선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주민들로 인해 재산 축적은 어려웠다. 일부는 단기 노동을 위해 입국했지만, 대부분은 영구 정착과 시민권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891년 아무르 총독 바론 코르프(Korf)는 한국인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 명령을 발표하였다.
첫째, 1884년 6월 이전에 이주한 사람들은 러시아 시민권과 토지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았다.
둘째,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조선으로 송환 대상이 되었다.
셋째, 임시 거주자들은 특별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거주가 허용되었다.
이 조치는 한국인 사회 내부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켰다. 토지를 소유하고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은 ‘110인(스도셴니키, стодесятники)’이라 불리는 부유층을 형성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러시아 대학을 졸업한 첫 세대의 교육받은 한국인으로 성장하였다.
예로부터 교육은 한국인 사회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낯선 땅에서도 그들은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러시아 제국의 일원이 되면서 한국인들은 ‘러시아화(Русификация)’ 정책에 직면했다.
대부분의 한국인 이주민들은 조선 북부 출신으로, 서울 표준어와는 다른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방언은 고려사람들의 독특한 언어 형태인 ‘고려말(Корё мар)’의 기초가 되었으며, 15세기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보존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러시아어 학습은 이주민들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나세킨(Н. Насекин)은 다음과 같이 썼다.
“러시아 정부의 목표가 이민자들의 빠르고 확실한 동화에 있다면, 그 핵심 수단은 바로 러시아 학교일 것이다.”
1866년, 동시베리아 총독은 포시에트 항구에 러시아어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자금을 지원하였다.
극동 지역의 러시아어 교육은 국가학교, 교회 부속학교, 그리고 선교학교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인들은 언어 습득이 사회적 지위 향상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였다. 특히 러시아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지역의 한국인들이 그러했다.
20세기 초, 계몽운동가들과 항일운동가들, 그리고 공동체의 지원 덕분에 거의 모든 한국인 마을에는 학교가 세워졌다. 1917년까지 극동 지역에는 초등교육이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교육의 대중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금 부족, 교사 인력의 결핍, 그리고 고립된 거주 형태가 주요 장애 요인이었다.
학교와 더불어 정교회 역시 교육과 계몽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많은 사제들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종교 지도자이자 교사로서의 역할을 겸하였다. 한국인 교육은 선교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러시아어 교육은 종종 정교 개종으로 이어졌다.
프르제발스키(Н.M. Пржевальский)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한국인들의 러시아화에 중요한 수단은 정교회의 선교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육, 문화, 종교 전통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러시아–한국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는 러시아 내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독특한 역사적 출발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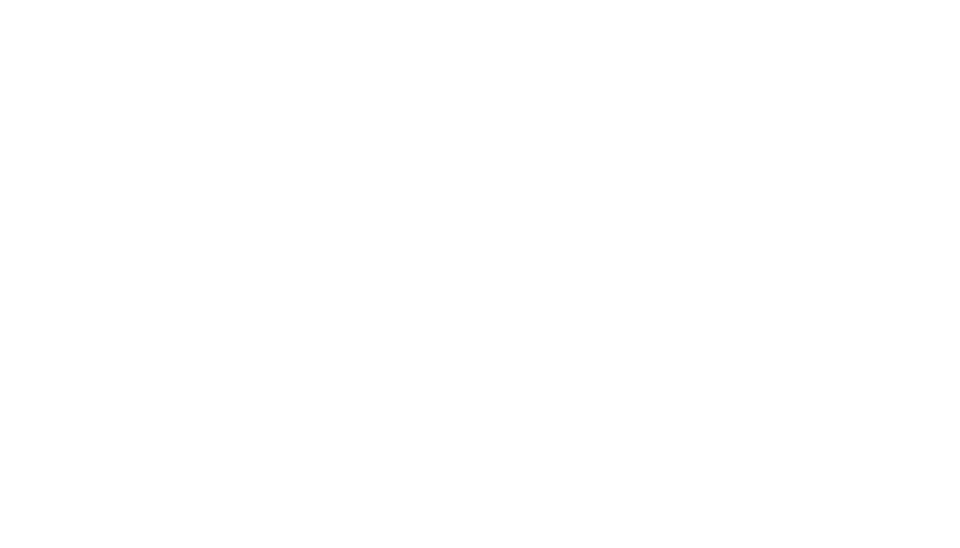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인 아동 학교의 유세비 주교(니콜스키).
정교 수용과 적응 과정
정교(러시아 정교회)로의 개종은 사실상 러시아 시민권 취득과 동일시되었으며, 한국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화는 그들의 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성직자, 관리, 자선가들은 한국인 이주민들을 러시아 문화와 국가 체제에 통합시키는 방편으로 정교 신앙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수용은 단순히 영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익도 있었다. 정교 신자로 세례를 받은 한국인들은 토지를 비롯한 여러 시민적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외국 신분을 유지한 사람들은 부유한 지주 밑에서 품팔이를 하거나 토지를 임차해야 했다.
그러나 정교로의 개종이 반드시 기존 신앙 체계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러시아 이주 이전의 한국 사회는 샤머니즘, 불교, 유교, 도교가 공존하는 종교적 다원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한국인들은 민족 고유의 신앙 요소를 일정 부분 유지했다. 정교 신앙은 한국적 전통성과 결합되며 점차 독자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연구자 T. V. 볼코바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한국인들은 주변 민족의 종교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취하였다. 가정생활에서는 여전히 유교적 윤리와 전통 신앙에 기반한 의례를 지켰지만, 타민족 사회에서는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기독교화는 또한 이름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세례를 받으면 한국인들은 러시아식 이름을 부여받았고, 이는 새 환경에서의 교류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연구자 B. D. 박은 1863–1864년의 기록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티진헤 마을의 촌장 최웅익은 세례를 받고 러시아 장교 대부의 이름과 부칭을 따라 ‘표트르 세묘노프’로 불리게 되었다.” 제정 시대의 한국인들 사이에는 ‘아쿨리나’, ‘유베날리’, ‘프라스코비야’, ‘메포디’와 같은 고풍스러운 러시아 이름들도 존재했다.
러시아식 이름 사용은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 수단이 되었다. 러시아 관리와 주민들에게 한국 이름은 발음하기 어렵고 기억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러시아식 이름이 교류를 원활하게 했다. 그러나 다수의 한국인들은 동시에 본래의 한국 이름도 유지하며 고유 문화를 잃지 않으려 했다.
정치적 활동과 민족 의식
19세기 후반, 열강들 간의 극동 지역 패권 경쟁이 격화되었다. 1904–1905년 러일전쟁에서의 러시아 패배는 일본의 세력 확대를 초래했고, 결국 1910년 조선 병합으로 이어졌다. 조선은 일본 제국의 총독부로 전락하였으며, 모든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강제로 부여받았다.
일본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한국인들의 새로운 이주 물결이 발생했다. 러시아로 이주한 한국인들은 점차 시민적 자각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 단체와 무장 조직인 ‘의병(義兵)’을 결성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극동 지역에서 활동한 주요 단체로는 1909년 결성된 ‘국민회(國民會, Kunkminhoe, 조선 국민회)’와 1911년 ‘권업회(勸業會, Kwonophoe, 근로 진흥회)’가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제정 러시아 정부는 정치 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고, 그들의 활동은 점차 중단되었다.
러시아의 패배는 사실상 조선 자주성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사건이었다. 많은 이주민들에게 블라디보스토크는 ‘반(半)자치의 마지막 요새’로 남아 있었으며, 일본 식민 통치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는 희망의 도시로 인식되었다.
한국인들의 항일운동 참여는 러시아 사회의 정치·사회적 삶으로의 통합을 촉진했다. 그들의 독립운동은 단순한 민족 해방의 차원을 넘어, 러시아 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위치 확립과 자아정체성 형성의 과정이기도 했다.
산업 및 사회 생활 속의 한국인들
20세기 초, 러시아 전역에서 혁명적 분위기와 노동운동이 확산되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도 이에 동참하며 러시아 노동자들과의 평등을 요구했다.
1906년 2월 13일, 팀프턴(Timpton) 금광 회사의 한국인 노동자 전원이 파업에 돌입했다. 그들은 러시아인 노동자와 동일한 식료 배급을 요구하며, ‘황인(黃人)’에 대한 차별적 조항의 철폐를 주장했다. 당시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러시아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인들은 점차 산업 생산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국가 및 민간 기업에서 일하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숙련 노동자로 성장했다. 교육을 받은 이들은 행정기관, 상업회사, 대기업 등에서도 근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 사회가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생활에서 근대적 산업 구조로 옮겨가는 과정을 의미했다. 그 결과, 러시아 내 한국인 공동체는 근면하고, 교육받으며, 사회 참여도가 높은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정교(러시아 정교회)로의 개종은 사실상 러시아 시민권 취득과 동일시되었으며, 한국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화는 그들의 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성직자, 관리, 자선가들은 한국인 이주민들을 러시아 문화와 국가 체제에 통합시키는 방편으로 정교 신앙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수용은 단순히 영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익도 있었다. 정교 신자로 세례를 받은 한국인들은 토지를 비롯한 여러 시민적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외국 신분을 유지한 사람들은 부유한 지주 밑에서 품팔이를 하거나 토지를 임차해야 했다.
그러나 정교로의 개종이 반드시 기존 신앙 체계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러시아 이주 이전의 한국 사회는 샤머니즘, 불교, 유교, 도교가 공존하는 종교적 다원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한국인들은 민족 고유의 신앙 요소를 일정 부분 유지했다. 정교 신앙은 한국적 전통성과 결합되며 점차 독자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연구자 T. V. 볼코바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한국인들은 주변 민족의 종교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취하였다. 가정생활에서는 여전히 유교적 윤리와 전통 신앙에 기반한 의례를 지켰지만, 타민족 사회에서는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기독교화는 또한 이름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세례를 받으면 한국인들은 러시아식 이름을 부여받았고, 이는 새 환경에서의 교류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연구자 B. D. 박은 1863–1864년의 기록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티진헤 마을의 촌장 최웅익은 세례를 받고 러시아 장교 대부의 이름과 부칭을 따라 ‘표트르 세묘노프’로 불리게 되었다.” 제정 시대의 한국인들 사이에는 ‘아쿨리나’, ‘유베날리’, ‘프라스코비야’, ‘메포디’와 같은 고풍스러운 러시아 이름들도 존재했다.
러시아식 이름 사용은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 수단이 되었다. 러시아 관리와 주민들에게 한국 이름은 발음하기 어렵고 기억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러시아식 이름이 교류를 원활하게 했다. 그러나 다수의 한국인들은 동시에 본래의 한국 이름도 유지하며 고유 문화를 잃지 않으려 했다.
정치적 활동과 민족 의식
19세기 후반, 열강들 간의 극동 지역 패권 경쟁이 격화되었다. 1904–1905년 러일전쟁에서의 러시아 패배는 일본의 세력 확대를 초래했고, 결국 1910년 조선 병합으로 이어졌다. 조선은 일본 제국의 총독부로 전락하였으며, 모든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강제로 부여받았다.
일본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한국인들의 새로운 이주 물결이 발생했다. 러시아로 이주한 한국인들은 점차 시민적 자각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 단체와 무장 조직인 ‘의병(義兵)’을 결성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극동 지역에서 활동한 주요 단체로는 1909년 결성된 ‘국민회(國民會, Kunkminhoe, 조선 국민회)’와 1911년 ‘권업회(勸業會, Kwonophoe, 근로 진흥회)’가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제정 러시아 정부는 정치 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고, 그들의 활동은 점차 중단되었다.
러시아의 패배는 사실상 조선 자주성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사건이었다. 많은 이주민들에게 블라디보스토크는 ‘반(半)자치의 마지막 요새’로 남아 있었으며, 일본 식민 통치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는 희망의 도시로 인식되었다.
한국인들의 항일운동 참여는 러시아 사회의 정치·사회적 삶으로의 통합을 촉진했다. 그들의 독립운동은 단순한 민족 해방의 차원을 넘어, 러시아 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위치 확립과 자아정체성 형성의 과정이기도 했다.
산업 및 사회 생활 속의 한국인들
20세기 초, 러시아 전역에서 혁명적 분위기와 노동운동이 확산되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도 이에 동참하며 러시아 노동자들과의 평등을 요구했다.
1906년 2월 13일, 팀프턴(Timpton) 금광 회사의 한국인 노동자 전원이 파업에 돌입했다. 그들은 러시아인 노동자와 동일한 식료 배급을 요구하며, ‘황인(黃人)’에 대한 차별적 조항의 철폐를 주장했다. 당시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러시아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인들은 점차 산업 생산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국가 및 민간 기업에서 일하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숙련 노동자로 성장했다. 교육을 받은 이들은 행정기관, 상업회사, 대기업 등에서도 근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 사회가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생활에서 근대적 산업 구조로 옮겨가는 과정을 의미했다. 그 결과, 러시아 내 한국인 공동체는 근면하고, 교육받으며, 사회 참여도가 높은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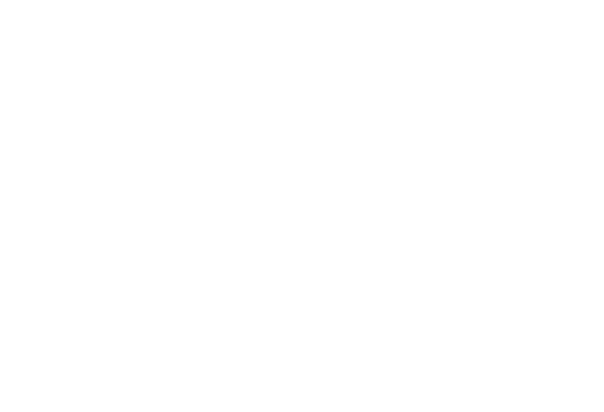
Группа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при постройке Уссурий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사회경제적 변화와 한국인 노동문화의 형성
19세기 말에서 볼셰비키 집권 이전까지 러시아 제국은 농업 중심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었다. 같은 시기 조선은 여전히 농업 중심의 국가로, 자급경제의 심각한 위기와 사회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었다. 식민지 이전의 조선에서 일부 수공업 형태의 제조업이 등장하기는 했으나, 대부분은 서울과 주요 지방 도시, 그리고 외국 무역항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대다수의 인구, 특히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북부 지방 출신 한국인들은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인들이 산업 생산과 관련된 직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사회문화적 적응의 중요한 단계였으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깊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집단적 사고와 상호부조, 그리고 협동의식을 키워나갔다. 이러한 집단의식은 노동자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전문지식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직종을 배우고, 복잡한 기계와 장비를 다루는 기술을 익히며, 직업적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셋째, 그 결과 고숙련 노동자와 기술전문가층이 형성되었고, 이는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생활방식에서 근대적 산업노동 구조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넷째, 외형적 모습과 일상생활의 변화가 뒤따랐다. 광산, 채굴장, 공장 등 산업 환경에서는 전통 의복이 불편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점차 러시아식 작업복으로 바꾸어 입게 되었다.
전통적인 한국 남성의 복장은 저고리와 넓은 바지(바지)로 이루어졌으며, 발에는 흰 천양말(버선)을 신었다. 이러한 복장은 광산이나 공장 같은 산업현장에서 일하기에 매우 부적합했기 때문에, 실용적인 러시아식 작업복으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노동에 종사한 한국인은 극동 지역 전체 인구의 일부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러시아 제국 경제 구조에서 농업이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며, 토지 개척이 이주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에서 볼셰비키 집권 이전까지 러시아 제국은 농업 중심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었다. 같은 시기 조선은 여전히 농업 중심의 국가로, 자급경제의 심각한 위기와 사회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었다. 식민지 이전의 조선에서 일부 수공업 형태의 제조업이 등장하기는 했으나, 대부분은 서울과 주요 지방 도시, 그리고 외국 무역항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대다수의 인구, 특히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북부 지방 출신 한국인들은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인들이 산업 생산과 관련된 직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사회문화적 적응의 중요한 단계였으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깊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집단적 사고와 상호부조, 그리고 협동의식을 키워나갔다. 이러한 집단의식은 노동자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전문지식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직종을 배우고, 복잡한 기계와 장비를 다루는 기술을 익히며, 직업적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셋째, 그 결과 고숙련 노동자와 기술전문가층이 형성되었고, 이는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생활방식에서 근대적 산업노동 구조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넷째, 외형적 모습과 일상생활의 변화가 뒤따랐다. 광산, 채굴장, 공장 등 산업 환경에서는 전통 의복이 불편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점차 러시아식 작업복으로 바꾸어 입게 되었다.
전통적인 한국 남성의 복장은 저고리와 넓은 바지(바지)로 이루어졌으며, 발에는 흰 천양말(버선)을 신었다. 이러한 복장은 광산이나 공장 같은 산업현장에서 일하기에 매우 부적합했기 때문에, 실용적인 러시아식 작업복으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노동에 종사한 한국인은 극동 지역 전체 인구의 일부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러시아 제국 경제 구조에서 농업이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며, 토지 개척이 이주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볼코바 T.V. 「러시아의 한국인들: 자기정체성 문제에 대하여」 (Волкова Т.В.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 вопросу о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 ЭО. 모스크바, 2004. №4. pp. 27–42.
- 그라베 V.V. 『아무르 지역의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Граве В.В. Китайцы, корейцы и японцы Приамурья) / 아무르 원정대 보고서 (Труды Амур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상트페테르부르크: V.F. 키르슈바움 인쇄소 (Тип. В.Ф.Киршбаума), 1912. 제11권. 489쪽.
- 칼리셰프스키 M.A. 「‘고려사람’의 방랑은 끝날 것인가? 중앙아시아 한국인의 러시아 이주」 (Калишевский М.А. Придет ли конец скитаниям «корё сарам»?) // http://www.arirang.ru/news/2007/07021.htm
- 김 G.N.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한국인 교육사: 19세기 후반』 (Ким Г.Н. История просвещения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в.). 알마티: 알파라비 국립대 출판부 (Изд-во КазГУ им. Аль-Фараби), 2000. 369쪽.
- 김 G.N. 『대한민국』 (Ким Г.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알마티: 다이크프레스 (Дайк-Пресс), 2010. pp. 113–118.
- 김 P.G.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한국인: 역사와 현대』 (Ким П.Г. Корейцы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Ўзбекистон), 1993. 176쪽.
- 김승화. 『소련 한국인의 역사에 관한 에세이』 (Ким Сын Хва.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알마아타: 나우카 (Наука), 1965. p. 62.
- 『소련의 한국인들: 1918–1937년 소련 언론 자료집』 (Корейцы в СССР. Материалы советской печати 1918–1937 гг.) / 편집: 바닌 Yu.V., 박 B.B., 박 B.D. 모스크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2004. p. 140.
- 쿠진 A.T. 『극동 한국인: 삶과 운명의 비극』 (Кузин А.Т.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орейцы: жизнь и трагедия судьбы). 유즈노사할린스크: 극동출판사 사할린 지부 (Сахалинское отд. Дальневост. изд-ва), 1993. 368쪽.
- 란코프 A.N. 「CIS 한국인, 혹은 러시아에서의 유교도들의 특별한 모험」 (Ланьков А.Н. Корейцы СНГ, или Необыкновенные приключения конфуцианцев в России) // http://old.russ.ru/politics/20020109-lan.html
- 란코프 A.N. 「CIS 한국인: 역사 속의 한 페이지」 (Ланьков А.Н. Корейцы СНГ: страницы истории) // http://okoree.narod.ru/d25.htm
- 노비코프 K. 「한국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역사」 (Новиков К. История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 http://mytashkent.uz/2007/08/31/istoriya-deportatsii-koreytsev-v-sentralnu-yu-aziyu/
- 박 B.D., 부가이 N.F. 『러시아에서의 140년: 러시아 한국인의 역사』 (Пак Б.Д., Бугай Н.Ф. 140 лет в России. Очерк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모스크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ИВ РАН), 2004. 464쪽.
- 박 B.D. 『러시아 제국의 한국인 (극동시기)』 (Пак Б.Д. Корейцы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период)). 모스크바: 모스크바대학교 출판부 (Изд-во МГУ), 1993. 261쪽.
- 사기토바 O.I., 프로조로바 G.V. 「연해주 지역 한국인 아동을 위한 선교 학교 (19세기 후반–20세기 초)」 (Сагитова О.И., Прозорова Г.В. Миссионерские школы для корейских дет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 начало XX вв.)) // 중앙아시아 한국학 논문집 (Извес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알마티, 2007. №5 (13). pp. 181–187.
